이 증언록은 역사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다시피는 녹두꽃』(1994)과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1997)을 원문 그대로 탑재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전공 연구자들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을 직접 만나 유족이 증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평서(鄭平瑞)
1847~1894. 12. 28. 진주(晋州) 정씨(鄭氏). 본명은 상규, 일명 평오(平五).
정동표(鄭東杓)
1938. 7. 17~1995. 4. 11. 정평서의 증손. 유족회에 가입하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살리는 데 노력을 하였으나, 증언록 출판을 보지 못하고 타계.
1957. 9. 7~ .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운송관계 일에 종사. 형님이 돌아가신 후 그동안 증조부님 일에 무관심한 것을 후회. 유족회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 처신하기에 불편하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있음.
1922. 4. lI~ 정평서의 종증손. 80년대에 4~5년 소를 길렀는데 소 수입으로 실패함. 30여 년간 인쇄업을 했으며 현재도 광주에서 제일문화사 운영.
prw_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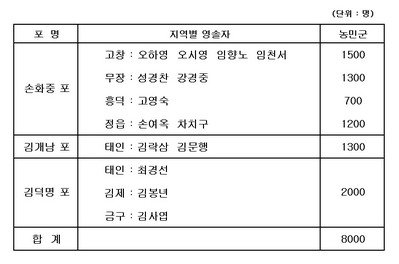
배항섭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정동표는 정평서의 증손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였으나, 1995년 봄에 세상을 떠났다. 정동표의 동생 정오남이 그 대신 증언하려 하였으나 어머니와 형님이 살아계실 때 무관심했던 관계로 증조부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일찍이 집안어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유족회에 적극 참여하였던 정오남의 종형 정상옥으로부터 증언을 채록하였다. 정평서의 집안은 임진왜란 무렵부터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에서 세거(世居)하여 왔다. 집안의 경제형편은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글공부도 충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인됨이 똑똑하였고 강단이 있어서 마을이나 인근에 제법 행세를 하며 살았던 듯하다.
가난했어. 별 부자는 아니고 먹고는 살았어. 근디 그 냥반은 재산 모을라고 돈을 취한 양반은 아니여. 돈 있으면 다 쓰고 나눠주고 술먹고. 상당히 말을 잘하고 송사, 재판하는 문서, 고소장 그런 것을 붓으로 쓰던 못해도 말로 다 해결을 해서 일러준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긴다고. 그대로 고소장을 쓰면 이기고 다 그랬다고. 판단력이 좋은 양반이고. 행교 출입도 허시고 이러트먼(이를테면) 출퇴꾼이어. 옛날 같으면 농사지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지방유지허고 살으셨제. 선비로.
정평서의 인물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일화가 전해진다.
옛날에 다래기라고 허는 우리가 갈려온 조상, 선조사는 곳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인제 본 일가하고 뭔 트러블이 문중 간에 싸움이 있었는데, 한두 해 겪은 것이 아니고 적은 일이 아니고 조상 계통에 대한 관겐데, 몇년 전 조상 때부터 끄서온(끌어온) 것을 그 하나씨(할아버지) 때 와가지고 그쪽 대표하고 할아버지가 요쪽 대표로 해서 원님한테 재판을 갔는데 그쪽에서 대표로 오신 분은 거기 도유사(都有司)인데 수염이 배꼽까지 허옇게 치닫고 체구가 큰 70배기 노인인데 우리 하나씨는 나이가 한 30대밖에 안 되고 젊은데 재판을 이겼대요. 한번은 함평행(향)교 전교 도유사를 허는데 함평행교를 항상 우물쭈물(좌지우지)하는데 자기 일생을 행교서 어른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함평군수가 새로 부임을 허니까 인사를 갔을꺼 아니어? 지방의 어른으로 인사를 갔는데 거그서 서로 초면인사허고 원이 대접하는 술을 자시고 나중에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우리 하나씨 도포자락이 문설주에 걸렸어. 우리가 정가니까 나구(귀) 아니여? (그래서) 안에서 작별인사허고 보낸 원이 나구 꼬리가 길다고 핀잔을 주니까 우리 하나씨가 다시 문을 열고 들여다보며 외양간이 좁은 탓이요 그랬다고. 또 거시기 우리 마을 너매 산안이라는 동네가 있어. 옛날에는 그 마을 앞을 지내가면 사람들이 껀뜩허면 넘의 동네 왔다고 봉변당하기 일쑤였거든. 처녀들이고 넘의 동네 함부로 못 다녔다고 저 혼자는. 그런디 함평서 따따부따 허는 놈이 넘의 동네 산안이란 데를 왔다가 동네사람들 시정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챙피를 당했어. 양통(몹시) 두드려 맞었어. 동네사람들한테. 그 뒤에 분풀이를 할라고 지가 수성군, 요새 같으면 형사대장이나 포졸, 순경들을 몰고 산안에 와갖고 동네사람들을 앵기는 대로 막 뚜들고(두들기고) 살림을 부수고 복수헌다고 난리를 쳤거든. 그렁께 동네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재 너머서 우리 하나씨한테 쫓아왔어, 그렁께 우리 하나버지가 갓도 안 쓰시고 그대로 딱 넘어가시더니 탁 버티고 서서 니놈들 국록을 먹고 국사한다는 놈들이 사형(私刑) 갚고 다녀? 이렇게 꾸짖고. 서울 김판서한테 연락을 해서 당장 주릿대를 튼다고 호령을 헌깨 요놈들이 쳐다보더니 다 내빼더래. 그놈들도 쳐다보면 인물을 보면 알겄고. 시골사람이 요새 같으면 서울 내무부장관 이름 대면 그냥 쩔쩔 매재 옛날이라. 그런 식으로 그놈들을 호령을 헌께 내뺐대. 그 사람들이 그런 은덕을 공로로 (여겨) 우리 선산이 있는데 거그다가 뫼 두 자리를 지그들이 밥 싸가꼬와서 석축해줬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우리는 구두로만 듣고 있재.
이러한 몇 가지 일화를 통해 비록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앞장 서서 해결해 주곤 하던 정평서의 성품과 비록 가난한 시골사람이었지만 수령에게도 호락호락 숙이지 않는 강단과 호방함을 엿볼 수 있다. 정평서가 살던 함평군 해보면은 불갑산을 끼고 영광군과 접해 있다.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 본대는 전주 쪽으로 북상하였다가 다시 남하하여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영광과 함평 일대에 진을 치고 농민군을 규합하고 있었다. 정평서가 농민전쟁에 본격적으로 가담한 것도 이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책에서 본 이야긴데 우리 마을 근처에다 앞에다가 깃대, 영기 꽂고 동학군들 훈련시키고 사방에 보초 시우고 산봉대기로 밥 해서 올려가고, 함평가서 전투허고 훈련하다가 동학군이 무장, 영광 다 접수를 하고 영광에서 밀재를 넘어와서 우리 고을 있는 데서 합세해서 함평을 갔거든.
정평서의 일가친척은 물론 그 마을이나 인근 마을에서 동학에 입도한 것은 정평서가 유일하였다 한다.
동학에 입도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 하나씨말고 집안에 다른 분이 참여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 그런 기록도 없고. 면내 가까운 이웃마을에도 없어.
『동학란기록』에는 정평오(평서)를 함평의 대접주(大接主)라 하였다. 다음과 같은 증언도 농민군 내부에서 정평서가 차지했던 위치가 범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마을 앞에 시정이라는 데가 있지요. 그 양반이 시정 앞을 지나가면 농군들이 전부 내려와서 지시랑 밑에 섰다가 그 양반이 지내간 뒤에 올라가고, 그렇게 인물이 뛰어났다 해요.
정평서는 1894년 12월 9일 거괴(巨魁) 윤정보(尹正甫), 장경삼(張京三), 대접주 박춘서(朴春西), 김시환(金時煥), 윤찬진(尹贊辰), 김경문(金京文), 박경중(朴京仲) 등과 함께 함평에서 체포되었다(『동학란기록』하, 223쪽). 정평서는 농민군의 패색이 짙어지자 대동면 수암고랑이라는 깊숙한 산골로 피신했다가 체포되었다. 정오남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평서가 체포된 것은 밀고 때문이었다.
우리 고향의 집이 대밭이 많고 그런 디라 피신을 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구요. 잘은 모르겠는디 산에다가 호를 파놓고 숨으셨는데, 들어가시면서 도포자락이 걸렸던 모양이더라고. 누가 그것을 보고 고발을 했다는 것 같습디다.
체포된 정평서는 곧바로 나주로 이송되었으며, 거기서 처형되었다. 정평서는 죽음에 임박하여서도 자신의 행동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떳떳한 행동이었음을 밝히는 등 기개를 잃지 않고 평소의 호방한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나주 형무소에서 총살 당했어. 그때 잡혀서 나주 영문(營門)으로 갔는디, 그때는 일본군이 마구 총살하던 판이어. 우리나라 관원은 별로 일본군을 압도할 만한 권리가 없어. 이미 나라가 기울어논께. 나주 영문에 가서 총살을 당하는디, 영문에 영장(營將)이 있지. 요새 같으면 경찰서장인디, 여러 고을을 관할을 해. 함평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나주 영문에 매였어. 근디 나주 영문으로 압송되어갔고 총살당하셨는디, 마지막 음식을 주니까 생전 술도 잘 안자시고 허는 분이 쪽박으로 술을 한나 썩, 닭고기도 작작 찢어서 막 자시고 옆에 사돈되는 사람보고 너도 고기 먹어라고 고기를 주니까 파르르 떨고 못먹을 거 아니여. 요런 것하고 동사(同事)를 했거던(했기 때문에) 요모양 요꼴을 안 당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나 이놈들아 한 방에 쏘아라. “우리 농민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 나는 이 일을 택했다. 만약에 한 방에 못 쏘면 오늘 저녁 내 혼이 가서 느그 식구 싹 잡어먹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요.
그에게 아들이 있었으나 시신을 거두지 못하였다. 아들의 위인됨이 출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민군의 자식이라면 함께 죽여버리기까지 하던 패전 후의 살벌함 때문이었다.
시신은 못 거뒀제. 종진 하나씨가 출중하덜 못허분지고 자기 아버지 시신을 거둘 만한 자격이 못되는 사람이여. 그때는 갑오동학군 자손이다 식구다 허면 누구던지 쏴 죽여버리고 죽여부러도 누가 관여 안하니까, 종진이란 양반이 가먼 죽잉께 가보덜 못헌 거여. 그러나 죽기살기로 생명을 내놓고 내 아버진께 내가 챙긴다 했으면 가져왔지. [다른사람도 시신들] 전부 다 못 가져온 것은 아니니까.
정평서의 유족은 살던 마을이 집성촌인 덕분에 농민전쟁 당시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나, 농민전쟁이 끝나고 농민군 가담자는 물론 그 친인척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자 마을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타향으로 정처없이 떠돌며 서러운 밥을 먹으며 살아야 했다.
일가간끼리 살았으니께 그러제, 타성간에 살았으면 살아남지 못허제. 거그서 피해 살고, 어디로 간지는 모르것는데 늘 잡으로 다니니까 피해서 살으시고. 마을에서 세상 어디로 나가서 좀 살아줬으면 그런 식이었다고. 가난하게 살었제. 우리가 어려서 옛날에 짚신 같은 것 삼고 그런 것을 보고 살았어. 아버지까지 독자로 내려오시면서 아버지가 큰 형님을 보시자 숫제 할아버지가 품안에 놓고 키우셨대요. 자식들은 많고 그러니 남의 집 품 같은 것 팔고 또 집에서 술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파시고 우리들을 키우시고 그랬어요. 지금도 논이 한 400평 정도가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버시던 것이.
농민군 접주였던 정평서의 산소는 현재 그의 부인과 합장하여 해보리 선산에 모셔놓았다 한다.
 이 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