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언록은 역사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다시피는 녹두꽃』(1994)과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1997)을 원문 그대로 탑재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전공 연구자들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을 직접 만나 유족이 증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나방환(羅邦煥)
1838. 1. 3~1894. 4. 2.
나해균(羅海均)
1936~ . 중학교 서무과장을 지냈고 지금은 봉천동에서 상업에 종사.
prw_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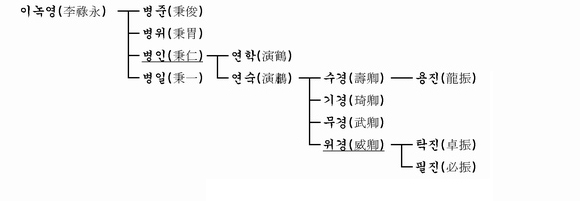
배항섭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나해균은 열댓 살에 어머니에게서 고조부의 이야기를 들었다. 고조부 나방환이 “갑오년 전투에 나가서 죽었다”는 아주 짧은 내용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고조부의 당시 입장을 여러가지로 추측하고 있다. 첫째,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했을 경우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단서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단정지을 수가 없다. 둘째, 관군일 경우이다. 당시 56세라는 나이에 관군에 소속될 수가 있는지, 관군이었다면 그의 사망소식이 가족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시신을 수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셋째, 구경하다 죽었을 경우이다. 이렇게 세 갈래로 추측하면서 그는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 하였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그의 집에 찾아가서 들은 이야기를 적어보면 이러하다. 고향은 충남 서천군 마서면 신포리(新蒲里)로 금강이 바라보이는 곳이다. 4월 2일 집을 나간 나방환은 김제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지역에서도 이미 무장기포가 일어나는 무렵부터 농민군들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었다. 특히 남접과 기맥이 통하고 있던 서장옥이 이끈 것으로 추정되는 진잠, 보은 옥천 등지에서 활발하였다. 그러나 북접교단에서는 남접에 호응하여 기포하는 행위는 엄단하자 충청지역의 농민군들 가운데는 전라도로 내려와 농민군 주력부대와 합세하는 자들이 많았다. 나방환도 이 무렵 인근의 농민군들과 함께 전라도로 내려 갔다가 그 곳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을 전후한 시기는 농민군 주력부대가 고부, 태인, 금구 등을 휩쓸고 있을 때였으며, 인근한 지역에서도 농민군들과 관군의 충돌이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사망 장소를 정확히 전해듣지 못해 집안에서 그곳으로 가서 시신을 찾아보았으나 못 찾고 울고 불고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이후 나무 토막에 이름을 써서 장사지냈고 나중에 할머니와 합장하였으며 5년 전에 묘비를 세웠다. 만약 서천, 한산 전투라면 시신을 수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조부가 사시던 집은 종가집으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나 아무도 살고 있지는 않다. 집은 마당보다 토방이 Im이상 높은 데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 같다. 실제로 중인 정도의 신분이 아닐까 나해균은 생각한다. 당시 살림살이는 수십 마지기의 논이 있어 마을에서 1등 갈 정도의 부자였으며, 증조부 때는 하인도 두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러한 재산을 조부가 노름으로 상당히 탕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약간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것도 도삼 씨가 향교 출입을 하면서 많이 팔아치웠다. 부친이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대가 약해서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 고조부 때문에 집안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며, 나씨 집안은 대대로 한학을 많이 하였다. 사랑방에 한문 선생을 모시고 공부를 했으며 지금도 시골 생가에 가면 궤짝에 한문서적이 많이 있다. 생가 방안에도 붓글씨로 낙서한 흔적이 남아 있다. 고려말 지금의 해군참모총장직을 지내신 나세(羅世) 장군이 집안어른이며 금강 옆에 비석을 세우는 데 관여하는 등 선조들에 대한 관심이 유별난 것 같다. 재종 당숙모(양집의 아들, 燾桭의 처 盧順姬)가 66세로 고향에 살고 있는데, 그집에서 어렸을때 집안 종회가 자주 있어 그분이 고조부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 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